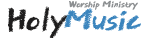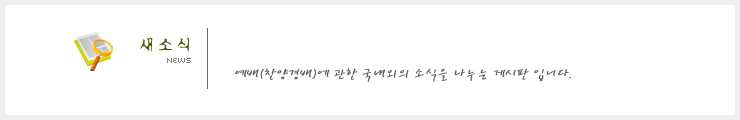
글 수 153
[박동희 집사의 ‘자녀교육 이야기’ ⑴] “아름다운 것은 마음으로 느껴야 한단다”

2004학년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특별전형에 합격한 최민석씨.그의 생애는 길지는 않지만 또 하나의 ‘인간승리’였다. 그러나 그 뒤에는 칠흑같은 어둠 속을 함께 걸어온 어머니가 있었다.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지평을 넓혀줄 지혜로운 기도의 여인의 자녀교육 이야기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엄마,오늘 우리 가족 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지난 3일 민석이는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일단 집에 오면 안다며 전화를 끊었다. 그제야 ‘우리 아들이 드디어 해냈구나’란 생각에 기쁨과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렸다.‘2004학년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장애인 특별전형을 통해 법학과에 지원했던 1급 시각장애인 최민석. 지난 주 많은 미디어들이 민석이 이야기를 집중 조명했지만 우린 사실 심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웠다. 이제 시작이며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기 때문이다.
합격자 발표 직후 온 가족이 부둥켜안고 기뻐했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했다. 며칠 전 민석이와 서울대학교에 다녀왔다. 이곳은 지난 몇년간 우리 가족의 ‘바라봄의 믿음’을 키운 곳이었다. 우리 부부는 틈만 나면 민석이와 함께 서울대 캠퍼스를 산책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민석이는 이곳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장차 사회에 나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꿈을 키워갔다. 감사하게도 학교측에서는 캠퍼스에 시각장애인용 신호등과 유도블록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오늘부터 개봉동 집에서 학교까지 전철과 버스를 이용한 본격적인 통학연습을 시작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너무 이른 것같지만 한때 우리처럼 절망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한 자락의 위안과 한 움큼의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다.
생애의 막다른 길같았던 1986년. 민석이가 다섯살 되던 해였다. 장난감을 갖고 놀던 아이가 눈이 아프다고 계속 칭얼거렸다. 인근 병원을 찾아가니 단순히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같다며 치료를 해주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후에도 아이는계속 고통을 호소했고 구토 증세까지 보였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다. 다시 병원으로 달려가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녹내장’이었다. 두눈의 안압이 갑자기 올라가 이미 시신경이 죽어가고 있으며 점차 시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치료를 시작했지만 의사는 희망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초교 1학년 때와 2학년 때 한차례씩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에도 별 차도가 없었다.
3학년 때는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개봉초등학교를 휴학했다. 그러나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아니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민석이의 시야는 180도에서 점점 좁아져 가고 있었다. 진행성이기 때문에 아이의 시력이 어느 정도 꺼져 가고 있는지 엄마인 나도 알지 못했다. 다만 아이의 걸음과 행동 등을 통해 감지했다.
민석이가 11세 되던 어느날 저녁. 저녁이면 자기방에 들어갈 때 전등 스위치를 켜고 들어가던 아이의 방에 불이 꺼져 있었다. 전등을 켠 것과 켜지 않은 것이 똑같이 느껴진다는 것은 이미 전맹이 됐다는 것이었다. 순간 내 가슴의 불도 꺼져버렸다.
“엄마 세상이 닫혀버린 것같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두려워요.”
“민석아,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란다. 그런 것들은 마음으로 느껴야 한단다.”
나는 아들에게 속삭였다.
“너의 창문에 불이 꺼지면 나의 마음엔 기도의 촛불이 켜진다. 최·민·석 글자 하나 하나를 촛불을 밝히며 기도한다. 그리고 너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사명이라고 확신한다. 민석아,아주 어두울 때 사람들은 별을 본단다. 고통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바라보고 있잖니.”
그때 나는 비로소 육신의 눈이 닫히고 영의 눈이 뜨이는 것을 체험했다.
제공=국민일보

2004학년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특별전형에 합격한 최민석씨.그의 생애는 길지는 않지만 또 하나의 ‘인간승리’였다. 그러나 그 뒤에는 칠흑같은 어둠 속을 함께 걸어온 어머니가 있었다.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지평을 넓혀줄 지혜로운 기도의 여인의 자녀교육 이야기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엄마,오늘 우리 가족 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지난 3일 민석이는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일단 집에 오면 안다며 전화를 끊었다. 그제야 ‘우리 아들이 드디어 해냈구나’란 생각에 기쁨과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렸다.‘2004학년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장애인 특별전형을 통해 법학과에 지원했던 1급 시각장애인 최민석. 지난 주 많은 미디어들이 민석이 이야기를 집중 조명했지만 우린 사실 심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웠다. 이제 시작이며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기 때문이다.
합격자 발표 직후 온 가족이 부둥켜안고 기뻐했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했다. 며칠 전 민석이와 서울대학교에 다녀왔다. 이곳은 지난 몇년간 우리 가족의 ‘바라봄의 믿음’을 키운 곳이었다. 우리 부부는 틈만 나면 민석이와 함께 서울대 캠퍼스를 산책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민석이는 이곳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장차 사회에 나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꿈을 키워갔다. 감사하게도 학교측에서는 캠퍼스에 시각장애인용 신호등과 유도블록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오늘부터 개봉동 집에서 학교까지 전철과 버스를 이용한 본격적인 통학연습을 시작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너무 이른 것같지만 한때 우리처럼 절망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한 자락의 위안과 한 움큼의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다.
생애의 막다른 길같았던 1986년. 민석이가 다섯살 되던 해였다. 장난감을 갖고 놀던 아이가 눈이 아프다고 계속 칭얼거렸다. 인근 병원을 찾아가니 단순히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같다며 치료를 해주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후에도 아이는계속 고통을 호소했고 구토 증세까지 보였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다. 다시 병원으로 달려가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녹내장’이었다. 두눈의 안압이 갑자기 올라가 이미 시신경이 죽어가고 있으며 점차 시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치료를 시작했지만 의사는 희망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초교 1학년 때와 2학년 때 한차례씩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에도 별 차도가 없었다.
3학년 때는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개봉초등학교를 휴학했다. 그러나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아니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민석이의 시야는 180도에서 점점 좁아져 가고 있었다. 진행성이기 때문에 아이의 시력이 어느 정도 꺼져 가고 있는지 엄마인 나도 알지 못했다. 다만 아이의 걸음과 행동 등을 통해 감지했다.
민석이가 11세 되던 어느날 저녁. 저녁이면 자기방에 들어갈 때 전등 스위치를 켜고 들어가던 아이의 방에 불이 꺼져 있었다. 전등을 켠 것과 켜지 않은 것이 똑같이 느껴진다는 것은 이미 전맹이 됐다는 것이었다. 순간 내 가슴의 불도 꺼져버렸다.
“엄마 세상이 닫혀버린 것같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두려워요.”
“민석아,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란다. 그런 것들은 마음으로 느껴야 한단다.”
나는 아들에게 속삭였다.
“너의 창문에 불이 꺼지면 나의 마음엔 기도의 촛불이 켜진다. 최·민·석 글자 하나 하나를 촛불을 밝히며 기도한다. 그리고 너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사명이라고 확신한다. 민석아,아주 어두울 때 사람들은 별을 본단다. 고통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바라보고 있잖니.”
그때 나는 비로소 육신의 눈이 닫히고 영의 눈이 뜨이는 것을 체험했다.
제공=국민일보